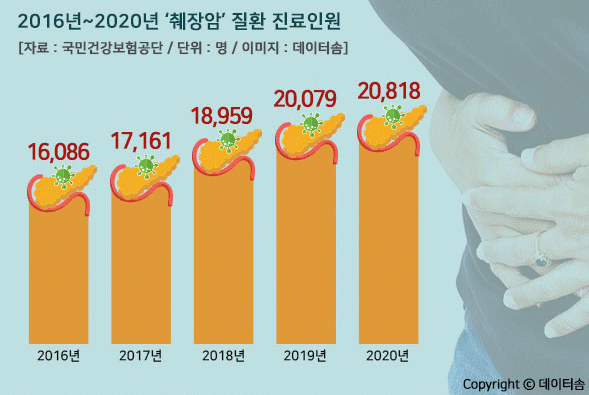
초기에 증상이 없고 종괴가 어느 정도 커져야 비로소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진 췌장암 진료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소화불량과 현저한 체중 감소가 눈에 띄는 경우, 60대 이후에 당뇨병을 진단받거나 음주를 하지 않고 담석이 없는데도 췌장염이 생겼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만한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이태윤 교수는 “동네 의원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내시경과 초음파로는 췌장암을 진단하기 어렵다”며 “종합병원 이상급에 있는 CT와 MRI를 통해서만 췌장암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조기진단의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췌장이 자리한 위치 때문이다. 췌장은 위(胃)와 간(肝)의 뒤쪽에 숨겨져 있다.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어 복부초음파를 할 때도 췌장 꼬리부분이 장관 내 가스에 가려 진단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 중 하나는 가족력이다. 부모와 형제·자매·자녀 가운데 췌장암 환자가 1명이 있으면 향후 ‘내’가 걸릴 확률은 4배 높아지고, 2명이면 6배, 3명이면 32배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췌장암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지목할 수는 없지만, 췌장암 환자 가족 수에 비례해 본인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미국 일부에서는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만50~55세부터 매년 한번은 CT 혹은 MRI를 통한 췌장암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재 췌장암 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60세 이후에 당뇨병이 생긴 경우 당뇨병이 췌장암의 결과 일 수 있어 췌장암 검진을 권한다.
이 교수는 "건강한 생활습관은 췌장암의 예방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금주, 금연, 절식과 충분한 야채섭취, 적당한 운동을 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학의 발달에 따라 췌장암은 일단 걸리면 몇 달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다”며 “췌장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절망하기 보다는 우선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치료를 잘 받아 보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솜=곽현아 기자]

